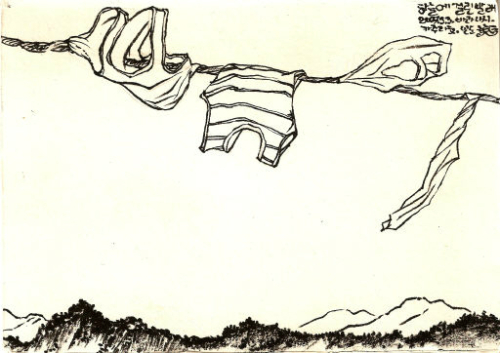|
| 가트가 있는 곳 삶은 활기차 보인다. |
인도 바라나시에서는 시간이 흘러가긴 하는 걸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보면 분명 하루는 지나갔는데, 시간은 멈춘 듯 바라나시 공간 안에서 맴돌고 있다.
바라나시의 갠지스강가 돌계단인 가트 중에는 화장터가 있는 마니카르니카 가트가 유명하다. 마니카르니카 가트는 도시에서 가장 큰 화장터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화장을 할 수 있다. 큰 배에 장작이 실려 오고, 그 장작의 무게를 재서 돈을 낸다. 살아 있을 때의 부에 따라서 화장을 하는 것도 차별화된다. 철저한 신분계급이 존재했던 영향이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시신이 들것에 실려서 골목길을 따라 들어오면 어떤 천으로 쌌는지만 봐도 그 사람의 계급을 알 수 있다. 금색 천으로 싸인 시신은 장작도 많이 쌓아서 활활 타오른다. 돈이 없으면 장작도 살 수 없어 완전히 태우지 못하고 타다만 시신이 갠지스강으로 던져진다.
 |
| 인도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도 환하게 웃으며 배를 탄다. |
이렇게 화장을 해서 갠지스강에 띄워야만 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인도인들에게 바라나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건 축복받는 일이다. 마니카르니카 가트에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음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알 수 있다. 힌두교에서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다만, 장작 타는 소리와 뿌연 연기만이 이곳을 감싼다. 대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들은 삭발을 한다. 나이가 어리건 많건 해야 한다. 죽음을 대하는 힌두교 방식이 곡을 해서라도 슬퍼했던 우리 문화와 사뭇 다르다.
 |
| 보트왈라는 배를 모는 사람을 뜻한다. |
사진을 찍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지만, 돈을 주면 찍게도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찍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몰래 찍다가 걸리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은 지켜야 한다. 다큐멘터리팀이라고 하면서 돈을 내고 대놓고 사진을 찍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진 않았다. 그들의 신념도 지켜줘야 하는 게 여행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어떤 것에도 정답은 없겠지만, 인도에서는 특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 큰 배에 사람들이 가득 탔다. |
화장터 가트는 오래 있기 힘들 만큼 냄새가 지독하다. 그곳을 빠져나와 가트를 걸어가던 중 소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하다고 여긴다. 힌두교 신 중에서 소를 타고 다니는 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쇠고기도 먹지 않고 신처럼 모신다. 하지만 인도 여행을 하다 보면 모든 소를 신성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도 소를 자세히 보면 등에 혹이 하나 있는 소와 두 개 있는 소가 있다. 혹이 하나 있는 소가 바로 신성한 소다. 검은색 물소는 신성한 소가 아니다. 그래도 먹지는 않는다. 길에 쓰러져 있던 소는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소였다. 사람들은 소를 돌보고 지키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이다. 다른 곳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살릴 수도 없다. 며칠 동안 쓰러져 있던 소는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소는 갠지스강에 흘려보낸다. 신성하건, 그렇지 않건 죽으면 갠지스강이 모두 거두어준다.
 |
| 갠지스강 건너편은 상대적으로 쓸쓸해 보인다. |
갠지스강 건너편에는 불가촉천민이 사는 마을이 있다. 불가촉천민이란 힌두교 계급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갔다.
 |
| 불가촉천민이 사는 마을로 향하는 여인의 뒷모습. |
내 앞으로 여자 한 명이 지나갔다. 그녀는 차분하게 모래밭을 걸어서 숲으로 연결된 어두운 마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발걸음을 옮겼다. 강 건너편에서 보는 바라나시는 활기차 보인다. 이곳은 황량한 모래바람이 분다.
 |
| 저녁 노을이 질 때 건너편에서 바라본 갠지스강 가트. |
다음 날, 가트가 끝나는 곳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는 결혼식 행진이 펼쳐지고 있었다. 길은 사람들과 소들로 가득 채워졌다. 코끼리까지 등장해서 더 꽉 채워진 길을 헤집고 구경을 했다. 하얀색 웨딩드레스 대신에 색색의 예쁜 사리를 입은 신부와 친구들이 걸어갔다. 사리는 인도 전통의상으로 지역마다 입는 방법과 형식이 약간씩 다르다. 인도는 주법을 따르며, 주마다 특색이 있다. 바라나시는 북쪽의 우타르프라데시주에 속한다. 힌디어를 쓰고, 외국 관광객이 많은 관계로 영어도 잘 통하는 지역이다.
 |
| 결혼행진으로 길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
다만, 힌디어가 공용어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다. 힌디어 외에 인도에는 14개 언어가 있다. 예를 들어, 구자라트주에서는 구자라트어를 쓰는데, 힌디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한 나라 안에서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신기하다. 생각해보면, 작은 땅인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으니, 인도같이 면적이 넓고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
| 결혼행진으로 길에 사람들이 넘쳐난다. |
바라나시 힌두대학교는 ‘BHU’라고 줄여서 부른다. BHU는 인도에서 손꼽히는 명문대다. 릭샤왈라에게 BHU를 가자고 했다. ‘릭샤’는 인도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와 개조된 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왈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릭샤왈라는 릭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트를 모는 사람은 보트왈라라고 한다. 대학교 안으로 릭샤를 타고 들어가서 미술대학이 있는 곳에 내렸다. 가트에서 만난 학생이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간 거였는데, 이미 끝났는지 전시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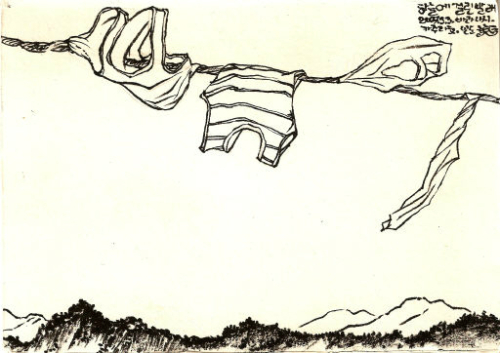 |
| 갠지스 가트에 널려 있는 빨래들이 바람에 휘날린다. |
잔디밭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들이 그리는 그림이 전시회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더 훌륭한 전시회일지도 모른다.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니, 미술대학을 다니던 시절이 생각났다. 함께하는 이들이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일 뿐 ‘다르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 모두 같은 ‘사람’일 뿐이다. 오랜만에 대학교 캠퍼스에서 붉어지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마감했다.
여행작가 grimi79@gmail.com
<세계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