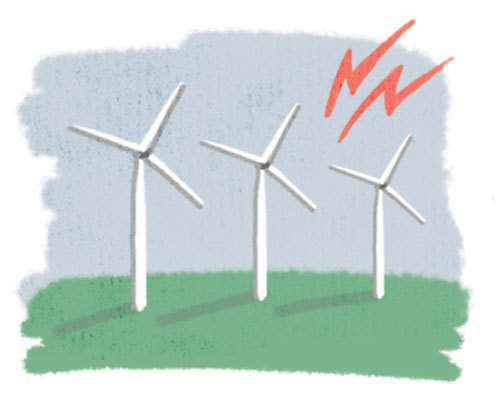
최근 경북 청송, 영양, 영덕군 등에서 풍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경북 청송군 주민 70여명은 청송 군청 앞에 모여 풍력사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재 102기가 가동되고 있는 경북 지역의 경우 새롭게 공사를 준비하는 발전기가 400여기를 넘었다. 강원, 경남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풍력 단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환경파괴와 소음, 저주파 등에 따른 건강권·재산권 피해다. 멸종위기종 생물의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산사태 등의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도 크다. 친환경을 위한 시도가 새로운 환경 갈등을 빚고 있는 셈이다.
풍력발전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이미 수년 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베를린 인근 우커마르크는 높이 100m나 되는 거대한 바람개비 수백개가 돌아가는 독일의 대표적인 ‘풍차마을’. 농촌마을이 친환경, 첨단 발전단지로 변모하자 처음에 반겼던 주민들이 경관 훼손과 소음공해, 점멸등 불빛 공해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기 추가 건립을 완강히 반대했다.
태양열과 함께 대체에너지로 주목받는 풍력발전은 바람에너지를 풍력 터빈을 이용해 기계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화석에너지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 정부가 풍력발전에 힘을 쏟는 이유다. 그러나 환경 파괴 논란이나 지역주민 반대를 해소할 방안이 뒤따르지 않으면 점점 더 갈등이 커질 것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안’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친환경을 내세운 ‘재생에너지 계획’이 오히려 환경문제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