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끼니까 안경이 흐려져 하나도 안 보여요. 한번 껴보고 안 껴요. 미세먼지 많은 날에 코가 끙끙하고 찌글찌글한데, 그냥 사는 거지 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신문가판점을 운영하는 안미순(76·가명) 할머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를 훌쩍 넘긴 지난 15일에도 민얼굴로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한다. 마스크 낀 채로는 도무지 일할 수가 없었다. 걱정되지 않느냐는 말에 안씨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오늘 가도 그만, 내일 가도 그만”이라며 웃었다.

그는 “지금 발도 시리다”며 난로 스위치를 돌린 뒤 “이러면 따뜻하지만, 사실 이것도 맘 편히 잘 못 켠다”고 말했다. 그를 만난 16일 바깥은 영하 3도였다.
인근 직장에서 일하는 이효성(36·가명)씨도 안씨 같은 부모님을 두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이면 그의 속은 더 타들어 간다. 부친이 어김없이 밭으로 나갈 걸 알기 때문이다. “마스크 좀 끼시라”고 신신당부하지만 소용없다. 그의 부친은 “시골에서 일일이 따져가며 어느 세월에 일해. 시간 나고 날 안 어설프면 해야지”라며 되레 아들을 타박한다.
미세먼지가 습격해도 실외에서 생업을 이을 수밖에 없는 이들은 수없이 많다. 퀵서비스·택배 기사, 주유소 직원, 주차관리 요원, 건설노동자 등 많은 이가 미세먼지 속에서 땀을 흘린다. 서울 중구청 통합방문간호사 유소진씨(46)도 그렇다. 유씨는 “이 일 하면서 호흡기가 정말 안 좋아졌다”며 “‘이러다 병 걸리면 어떡하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
| 수도권 지역에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자료사진 |
“미세먼지 많은 날은 안 쓰던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수시로 바꿔 껴요. 가급적 지하보도로 다니고요.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엊그제 미세먼지가 치솟은 다음 날 보니 편도가 부어 있더라고요. 피부도 쓰려요. 예전에는 피부가 건강했는데, 지금은 화장을 못 해요. 바깥일을 하면서 예민해진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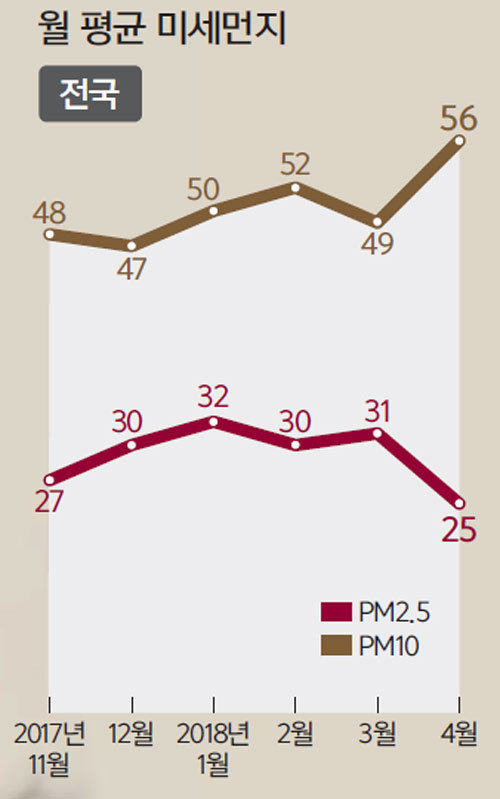
◆“온종일 밖에 나갈 필요 없어”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직종에는 보수가 낮거나 힘든 일자리가 많이 포함돼 있다. 반면 최신식 사옥을 지을 만큼 여유 있는 기업에서는 실내 공기 질까지 신경 쓴다. 직장이 미세먼지 피난처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 입주 기업에서 일하는 이지영(41·가명)씨는 지난 14일 퇴근길 호텔 벨보이, 주차 관리원을 보며 안타깝고 미안했다. 그는 실외에 나갈 필요가 거의 없다. 사무실은 지하철·지하주차장과 연결돼 있다. 몰 안에서 식사·진료·운동도 해결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라 서울시에서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 질도 검사한다.
“그날 종일 안에 있다가, 퇴근하면서 편의점·식당에 들르느라 잠깐 나갔어요. 그렇게 잠깐 먼지에 노출됐는데도 눈이 정말 매캐하고 뻑뻑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내 근무환경이 참 좋다고 느꼈어요.”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신사옥에서 일하는 40대 김모 차장도 요즘 사무실이 만족스럽다. 그는 “을지로에서 일할 때는 오후만 되면 눈이 뻑뻑하고 속이 답답했다”며 “새 빌딩은 공기정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인지 안에 있어도 답답하지 않다”고 했다. 김 차장은 “새 사옥이 층고가 높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것도 실내 공기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회사 16층에 직원 전용 병원이 있는 것도 안심이다. 그는 “점심시간 쪼개서 밖으로 나갈 필요 없이, 비염이 와도 바로 진료받을 수 있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어디 사느냐’가 ‘어떤 공기를 마시느냐’와 직결되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다. 주거 환경에 따라 누리는 공기 질이 다른 현상은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 중구 을지로동에 사는 김미자(83·가명)씨와 충북 청주의 신축 아파트에 사는 안이삭(38·가명)씨의 사례를 소개한다.
“여기는 옛날 집이라 아주 삭았어요. 바글바글해. 다 내려앉아서, 공기가 나쁘다 그러면 벌써 먼지가 들어와요. 그런 날은 가제 수건 위에 마스크를 하고, 잘 때도 다 쓰고 자요.”
서울 중구 을지로동 마른내로4가길. 지난 17일 유소진 통합방문간호사와 찾아간 김 할머니의 집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곳이었다. 2평(6.6㎡)쯤인 이곳에서 김씨는 25년을 살았다. 겨울엔 공동수도의 찬물밖에 못 쓰고 화장실은 재래식이다. 서울에서 전세금 1000만원으로 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김 할머니는 호흡기가 약하다. 잘 때도 마스크를 쓴다.
“젊어서 빌딩 청소하러 다녔어요. 45년 동안. 그때 염산을 많이 써서 몸이 나빠진 거야. 염산을 쓰면 연기가 파아악 나요. 냄새 맡으면 숨이 막 꽉꽉 막혀서, 뿌리자마자 바깥으로 뛰어나가고 했어. 바지가 뻥뻥 다 뚫어질 정도였죠.” “먼지를 먹으면 설사를 해버린다”는 김씨는 공기 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가 공기청정기에 온수·화장실이 있는 노인정을 꼬박꼬박 가는 이유다. 15분 거리라 걸어가기도 녹록지 않다.
“먼지 많은 날 걸어가면,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해요. 그럼 가다가도 골목에서 숨 좀 ‘헉헉’ 하고 가지. 아주 심한 날은 요 놈(협심증약)을 하나 먹어야 돼요. 항상 넣어서 댕겨요.”
같은 건물에 사는 김옥순(91·가명)씨는 몸이 아파 바깥 공기를 신경 쓸 여유조차 없다. 그는 “집에 있어도 날이 뿌여면 마스크를 한다”며 “(먼지 많은 날도) 안 나강게 괜찮다”고 말했다.

◆“신축 아파트 오니 걱정 덜어”
한편에서는 미세먼지를 막는 건축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청주에 사는 안씨는 요즘 “이래서 신축, 신축 하나보다”라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해 8월 생전 처음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한 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아도 걱정을 덜었다. 직전에 30년 된 아파트에 살 때 그는 6, 8살 두 자녀를 위해 온종일 공기청정기를 틀었다. 그런데도 바깥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만 되면 집안 PM2.5 농도 역시 30∼50㎍/㎥로 올라갔다. 건물 전체에 환기시스템이 설치된 새집은 달랐다. 밖이 뿌연 날도 집안 농도는 9∼15㎍/㎥를 벗어나지 않았다. 안씨는 “감기를 달고 살던 애들이 이사 온 후로는 기침을 거의 안 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미세먼지 관리 기술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헤파필터를 장착한 환기구, 출입구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에어샤워기, 놀이터용 미세먼지 신호등 등을 내놓았다. 대우건설도 단지 내 공기 정보를 제공하고 지하주차장·엘리베이터 공기 질까지 관리하는 등 ‘깨끗한 공기’를 이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