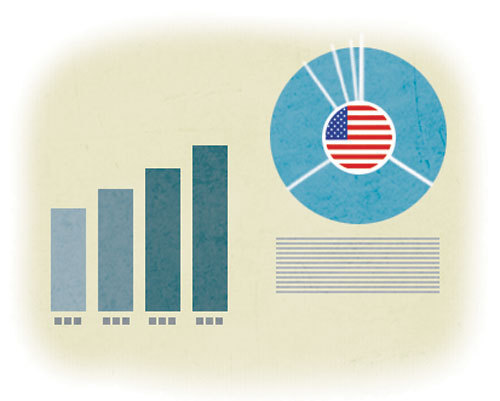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비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비행기가 6시간씩 괌에서 한국으로 날아가는 데 비용이 정말 많이 든다”고 했다. “한국도 협력하고 있으나 100% (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다”고도 했다. 동맹을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본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도 한·미 연합훈련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오래전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도 트럼프 스타일에 맞추려고 골머리를 앓는 모양이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 등 정보기관장들이 경제와 돈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입맛에 맞는 보고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면보고에서 국가안보 이슈나 국제분쟁 여파를 설명할 때도 경제 관련 수치가 들어간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한다. 트럼프가 “경제적 관점에서 국제 문제를 해석하라”고 다그치는 까닭이다.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트럼프는 “우리 장군님들은 비즈니스를 모른다”고 불평한다.
어느 국가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 때로는 안보나 동맹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안보는 비즈니스로만 보기에는 너무 엄중하다. 동맹을 ‘돈의 논리’로 다루다간 소탐대실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원재연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