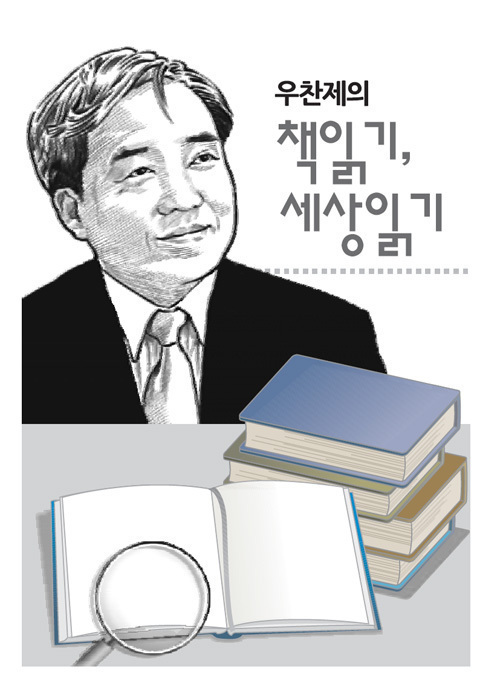
길가메시는 모든 것을 본 사람, 혹은 모든 지혜의 정수 내지 심연을 본 존재로 이야기된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경험했으므로 모든 것에 능통했던 자가 있었다.” 신들만의 숨겨진 비밀을 헤아렸고 그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내며 생의 심연을 향한 여정을 수행한 영웅적 캐릭터다. 그는 불멸의 신화에 도전했으나 필멸의 운명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자 가까스로 생명의 식물인 불로초를 구하게 되지만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뱀에게 빼앗기고 만다. 그가 그 식물 이름을 ‘늙은이(길가)가 젊은이(메시)로 되다’로 명명했었는데, 주인공 길가메시의 의미도 그러하다.
순간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길가메시의 이러한 질문은 고대 이래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었음에 틀림없다. 그 누구도 풀기 어려운 이러한 질문을 푸는 과정에서 길가메시는 영웅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과감하게 신들의 산을 범하기도 한다. 삼목산. 엄청난 고봉이 늘어서 있는 삼나무 숲을 관통하는 일은 당시에 인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겼다. 고대부터 신의 땅이라 불렸던 이곳은 무시무시한 훔바바가 지키고 있었는데, 길가메시는 엔키두와 더불어 훔바바를 제거해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한다. 최후의 순간에 신이 말렸음에도 결국 훔바바를 처단하게 되는데, 그 일에 앞장섰던 엔키두는 길가메시보다 먼저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서사시의 곁가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 오래 생각이 머문다. 신성한 삼나무숲지기를 죽였다는 것,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숲을 훼손하고 나무를 남벌하면서 인류 문명을 일구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몽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엔키두는 죽어가면서 길가메시에게 모든 것이 생명이 있었다는 것, 하늘도, 폭풍도, 땅도, 물도, 모두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을 남긴다. 생명 있는 것을 함부로 도모하고자 한 벌을 받게 된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도 “영원한 것은 저 생명나무의 녹색뿐”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영생이 불가능한 인간이 지구에서 영생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후손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려면 생명나무를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삼림 훼손이 진행 중이어서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이 상황을 어찌 해야 하는가. 그 어느 해보다 심각한 이 폭염의 나날을, 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도대체 어찌할 것인가. 만약 훔바바가 살아남아 숲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사정은 달랐을까. 마하트마 간디 역시 “나무를 보라. 스스로는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나무에게서 배우라”고 강조했다. 나무의 그늘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 서로의 그늘도 점점 소실돼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찬제 서강대 교수·문학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