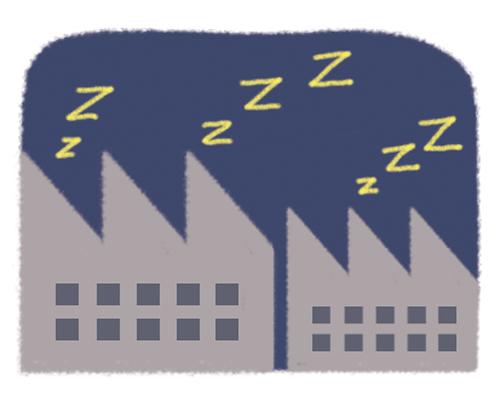
시화공단은 어떤 곳일까. 우리 경제의 용광로 같은 곳이다. 크고 작은 공장만 1만개. 서해산업벨트의 심장을 이룬다. 반월, 남동공단보다 배나 크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수많은 생활용품과 부품은 그곳에서 만들어진다. ‘세계의 공장’ 선전·광저우 경제특구에 비견할 만하다. 그래서 나온 말, “시화공단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망한다.” 그런 곳에 방이 텅 비어 간다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몇 개월 뒤인 지금에야 기사가 쏟아진다. “수도권 공단 불이 꺼져 간다”고. 주 52시간 근무제. 밤에는 공장 가동을 멈추고, 식당에는 저녁 손님이 사라졌다고 한다. 기업도, 식당 주인도 죽을 맛이다. 근로자는 ‘저녁 있는 삶’을 누릴까. 야근수당이 사라졌다. ‘투잡’을 뛰어야 할 판이다. 그것만 문제라면 버틸 만하지 않을까.
값싼 월세방은 왜 비어 가는 걸까. 기업이 떠났거나 일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뜻이다. 밤에는 왜 공장 불을 끄는 걸까. 일감이 없다는 뜻이다. 시화공단은 조선 불황, GM 공장 폐쇄와도 별 관계가 없다. 경기도 제조업체 취업자 통계를 봤다. 지난해 같은 때보다 7월 2만9000명, 8월 1만9000명, 9월 5000명 줄었다. 너나없이 밤에는 공장 불을 끄니, 투입된 노동력 총량의 감소폭은 훨씬 크다. 수도권 제조업체가 가을 낙엽 신세로 변한 판에 지방은 오죽할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리쳤다. “차 부품사 대출을 회수하지 말라”고. 1997년 외환위기로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파산으로 몰리던 때 듣던 소리다. 무슨 말일까.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의미다. 정작 “경제 컨트롤타워”라던 청와대는 아무 말이 없다. 국민 삶과는 별 상관없는 ‘쓸데없는 말’만 요란하다. ‘새로운 시대 정부’라서 그런 걸까.
강호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