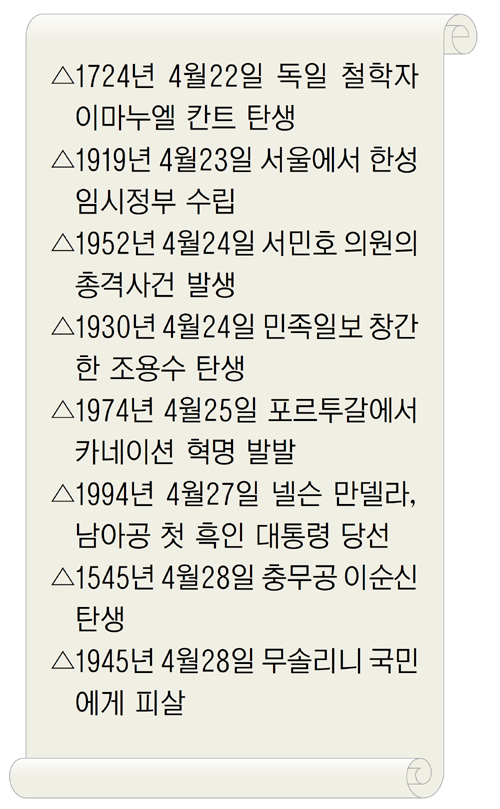1974년 4월25일 포르투갈에서 일어난 ‘카네이션 혁명’은 이름과는 달리 쿠데타였으나 카네이션처럼 아름다운 혁명으로 끝났다. 이 혁명은 2010년 튀니지에서 비슷한 별명으로 일어난 ‘재스민 혁명’과는 대조적이다. 그로부터 촉발된 아랍지역 혁명은 재스민 향기보다는 피비린내가 진동했었다.
하지만 카네이션 혁명에 이르기까지 포르투갈의 역사가 그처럼 아름다웠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너무 오래 혁명의 바탕이 성숙돼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32년에 집권한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총리는 36년간이나 독특한 ‘총리 독재’를 실시해왔다. 살라자르는 1968년 병으로 쓰러졌으나 마르셀루 카에타누가 뒤를 이어 총리독재를 폈다.
독재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킨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거리가 멀었다.
경제는 낙후한 데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가 손을 털어버린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막대한 인명과 국부만 축내는 전쟁을 계속했다.
보다 못한 좌파 군인들이 오텔루 사라이바 드 카르발류 대위의 주도하에 궐기하자 무능한 독재자들은 진압할 엄두도 못낸 채 투항하고 다음 날 망명했다.
그래서 국민은 거리의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주었고 군인들은 그것을 총구에 꽂았다. 카네이션으로 인해 총이 발사되지 않아서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은 채 혁명은 끝났다.
카네이션 혁명은 새삼 피레네 산맥으로 유럽의 다른 지역과 단절된 듯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특성에 눈길을 끌게 한다.
유럽이 동서로 갈려 이념대결이 한창이던 그 시절에 이 지역은 그런 것과도 담을 쌓은 채 중세를 떠올리는 2개의 독재국가가 존립하고 있었다.
당시 스페인도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38년째 총통독재를 펴고 있었다.일찍이 대항해 시대를 열어 남미를 차지했던 두 나라는 거꾸로 가장 낙후한 국가가 돼 있었던 것이다.
양평(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