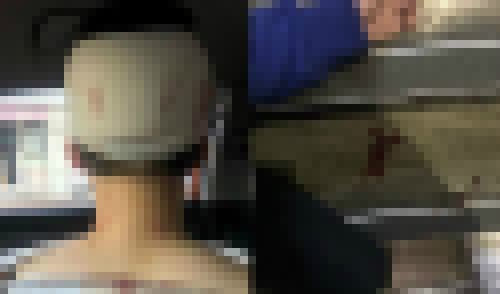
이번 사건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은 성 차별 이슈에 대해 급변 중인 시대상을 한참 거스른 것을 넘어 은근슬쩍 대중에 편승해 ‘여성혐오’를 강화하기까지 했다. ‘(남성중심사회의) 대중은 이러한 이야기에 반응하고, 저러한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는 모종의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언론이 변화와 진화를 거부하고 있는 대중을 핑계 삼았을뿐 아니라 그들에게 선동당하기까지 한 한심한 작태다. 여성혐오가 여전히 팽배한 사회에서 성 대결을 붙이거나, 애써 이를 방관하거나, ‘남성혐오’란 개념을 창조하고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기울여놓겠다는 무책임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폭행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라는 행위이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여성이 먼저 시비걸어”라는 헤드라인을 모든 언론이 줄기차고 일관되게 쏟아낼 만큼 ‘선 시비 여부’가 폭행이라는 본질을 앞설 수 없다. 그럼에도 대중 및 언론은 여성의 ‘시비털이’를 응징한 가해자측의 폭행에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부여하고자 애썼다. 여성들이 ‘맞을 짓 했는지’에 더 주목했고, ‘맞을 짓 한 것 같다’고 1초라도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혐오 사회’임을 방증하고 말았다.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화력 또한 어찌나 뜨거운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될 기세로 공론장을 망가뜨렸다.
여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탈코르셋을 했고, 비속어를 썼고, 먼저 손을 쳤고, 남성을 조롱했다는 디테일을 끄집어내 폭행이란 본질을 가리려 한 이 담대한 시도에서 남녀 주어를 바꾸어본다면 어떨까. 그래도 폭행이 일어날 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여자라서 당했다’는 여혐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언론이 이를 부정했다. 언론이 택한 방식은 언제든 굉장히 이성적인 분석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계적 중립’ 신공이었다. 경찰이 흘린 ‘쌍방폭행’이라는 매력적인 워딩을 덥썩 물고는 신나게 활용했다. 뜯어보면 남성들의 주장에 따라 쌍방폭행 여부를 그저 ‘조사 중’인 것으로, 폭행 사건의 진위에 어떤 영향도 내려진 결론도 없다고 발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
대중과 언론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쌍방폭행’이란 네 글자에 취해 가해자 측의 ‘피해자 코스튬’을 함께 주워입었다. 부상과 피해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났음에도 똑같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대치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같은 수준의 폭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상식은 굳이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여성혐오와 남성혐오의 뒤바뀐 실체다. 여혐은 있지만 없다고 하고, 남혐은 없지만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백래쉬 속에서 기이한 ‘성 대결’ 논리가 등장했다. 여혐은 강력범죄 주요 희생자부터 채용차별, 부당해고,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으로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직결되지만 ‘남혐’은 그렇지 않다. 반작용, 미러링으로 생겨난 ‘남성 개별에 대한 공격’(실은 방어에 가까운)을 여혐과 동등하게 놓는 것은 한참 부적절하다. 남성의 ‘기분권’과 여성의 ‘기본권’을 같은 무게로 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차별적인가.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여혐은 실재하지만 반대급부로 부상한 남혐은 허상에 가깝다는 불편한 진실. 이것이 이번 사건 보도를 통해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여성혐오 사회’의 현주소다. 언론이 그 민낯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실상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